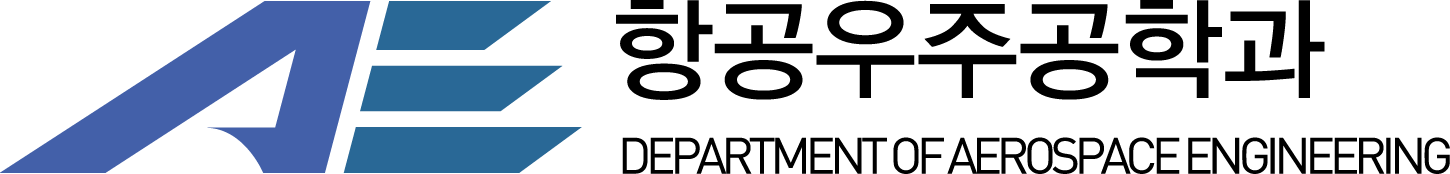공중의 감시자, 비행기의 '블랙박스'
-공중으로 향하는 두려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에 탑승한다. 비행기에 발을 내딛기 전,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마음속에 설렘을 잔뜩 안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비행기를 타야할 일을 앞에 두고서는 잠도 잘 오지 않는다. 작은 사고라도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비행기의 대형 사고들이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재생된다. 혹시 날개가 약간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작동하지 않는 엔진을 미처 점검하지 못했다면 어떡하지? 폭발물을 가지고 탄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상들이 망상으로 부풀 면서 나에게 비행기 탑승은 무거운 불안감을 던져준다.
하지만 항공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확률적으로 그렇다. 실제 2015년을 기준으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는 560여건이 발생했지만, 그 중 사망사건은 16건에 불과했다. 확률로 따진다면 485만 7000회마다 한 번 씩 일어나는 사건이다. 또 설령 사망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두가 사망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망사고들이 발생하는 항공기는 제 3세계의 후미진 비행체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해도 공중에서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일들은, 발을 땅에 붙이고 있는 지상에서보다 훨씬 위험한건 사실이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하여 하늘에 있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에서 벗어난 완전히 독립된 우주 안에 존재하게 된다. 그 곳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한들, 지상 세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순간은 모든 잔재들이 땅에 추락한 뒤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을 꿰뚫고 있는 ‘공중의 감시자’는 없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차량 부품으로 익숙한 ‘블랙박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

(picture1) 주황색의 블랙박스
- 검정색이 아닌 블랙박스?
블랙박스. 명칭부터가 어둡고 새까만 은신자와도 같은 색깔을 뽐내고 있을법하다. 속칭 ‘감시자’이니 어두운 색깔이 더더욱 어울려 보인다. 그러나 실제 블랙박스는 눈에 매우 잘 띄는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이루어져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형광물질을 덧입히기도 한다. 항공기 사고의 끝은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바다의 면적이 육지보다 훨씬 큰 지구 상공을 나는 비행기는 바다로 추락할 확률이 높다. 사고의 전말을 담고 있는 이 기계는 추락한 비행기에서 사람 다음으로 먼저 건져내야 되는 녀석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색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설령 육지로 추락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눈에 잘 띄어야 함은 변함이 없다.
크기와 무게는 제조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가로x세로가 60cm x 20cm로 되어있고, 높이는 20cm정도 그리고 무게는 10kg 남짓하다. 꽤 무거운 컴퓨터 본체쯤을 생각하면 적절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블랙박스는 약 1100도에서 가열되어도 30여분을 견딜 수 있고, 해저 6000m의 수압 속에서도 30일을 견딜 수 있는 특수 합금재질로 외피가 둘러져있다. 압력과 온도들이 이 외피를 뚫어낸다 할지라도 그 안쪽은 이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플라스틱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지상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빨리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땅속 깊숙이 박혀버린다 할지라도 자체적으로 전파를 발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린다. 이를 위한 자체 배터리 역시 장착되어 있으며 약 30일간 끊임없이 전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약 35.7KHz의 주파수로 전파를 낸다고 한다.)

(picture2) 머리와 꼬리에 나누어 탑재된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어떻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가?
블랙박스는 비행기의 발전에 따라 함께 진화해왔다. 초기 블랙박스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띠 모양의 시트 한 줄로 되어있었다. 이후 테이프가 등장하여 음성녹음의 기능까지 탑재하게 되었고, 현재는 컴퓨터 시대에 발맞추어 반도체 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이 블랙박스의 주요 역할은 항공기의 비행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다. 정확히는 FDR(Flight Data Recorder)와 CVR(Cockpit Voice Recorder)로 나뉘는데, 이 중 FDR은 꼬리쪽에 CVR은 반대쪽에 위치한다. 특히 이 둘은 항상 분리되어 저장되는데, 혹여나 항공기가 완파되는 초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그나마 피해가 적은 한쪽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이다.
FDR은 명칭대로 항공기의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 예컨대 비행기가 이륙한 뒤의 날씨상황이라든가 기압, 강수량, 바람 같은 것들. 그리고 계기판에 기록되는 모든 숫자들, 예컨대 항공기의 속도라든가 방향, 심지어 어느 부품이 어떤 방식으로 비정상적인 동작을 했는지도 모두 기록한다.
CVR은 소리에 초점을 맞춘다. 조종칸에서 공유되는 많은 소리들을 녹음하게 되며, 미국의 경우에는 1967년 이후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부품이다. 기존에는 테이프를 이용하여 녹음을 진행하다가 컴퓨터가 대체함으로 인해 녹음시간도 늘고 소리의 질도 크게 발전하였다.
요 두 녀석이 기록한 데이터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공중에서의 상황이 제대로 파악된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순간의 충격으로 두 기계가 고장이 나버린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가 되어버린다. 따라서 이 장치들은 매우 강한 압력과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후에도 그 수압을 모두 견뎌낼 수 있다. 그래야만 공중에서 일어난 상황들을 지상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으니 말이다.
현재 사용되는 CVR은 사고 발생 두 시간 전까지의 음성을 기록할 수 있다. 이 장치에는 조종사들의 대화내용과 운전석의 실내 음성 등 총 네 가지의 채널로 나누어져 기록된다. 인터넷에서 항공사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을 찾다보면 사고 직전에 조종사들의 대처와 사고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감정까지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CVR 자료들이 다수 존재한다.

(Picture 3) 말레이시아 항공 370편 추락사고의 전개
- 아직은 부족한 블랙박스
하지만 블랙박스 역시 완전하지 않다. 공중의 감시자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최종 진화형에 도달한 궁극의 장치는 아니다. 2014년에 말레이시아항공 370편 실종사건을 반면교사삼아 블랙박스가 보완해야 할 기능들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고에서 추락한 보잉777모델의 경우는 여객기 중 가장 안전한 편에 속하며, 십년이상을 무사고로 날아온 검증된 기체였다. 그러나 추락 후 기체를 발견하지도 못하여 현재까지도 미해결로 남아있는 사건이 되었다. 사고 직후 수색 팀은 베트남 남부 해상에서부터 인도양 전체를 대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 무려 수백km 반경을 수색한 끝에 인도양 남부에 이 기체가 추락한 것이 공식 확인되었다. 그러나 잔해를 포함한 실질적인 증거는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 보름의 수색 끝에 파묻혀있던 블랙박스의 전파 신호가 감지되었다. 다수의 기관이 신호를 확인하였고 수색 팀은 최대한 빠른 수색을 통해 기체가 추락한 지점을 확인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이어 블랙박스 배터리의 수명이 다했고, 수색범위를 크게 좁히지 못한 채 잠수정을 내려 보냈으나 수일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결국 수색은 종료되었고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사고를 통해 블랙박스가 보완해야 하는 기능은 역시 배터리의 수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배터리의 수명을 무한으로 늘릴 수는 없으므로, 블랙박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을 통해 지상으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위치가 정확하게 노출되며 이는 개인 보안과 관련된 논제로 탈바꿈되는 골칫거리가 된다.
공중과 지상 간 소통단절을 미약하게나마 이어줄 수 있는 하늘의 감시자 ‘블랙박스’. 이 물체는 공학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합의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더욱 완전한 기계로 발전할 수 있다. 세상이 진보하여 공중에서도 마음 놓고 활보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세상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블랙박스의 발전은 필수적이다.
원문 김태진[sll9794@kaist.ac.kr]
Comment 0
- Total
- 56호
- 55호
- 54호
- 53호
- 52호
- 51호
- 50호
- 49호
- 48호
- 47호
- 46호
- 45호
- 44호
- 43호
- 42호
- 41호
- 40호
- 39호
- 38호
- 37호
- 36호
- 35호
- 34호
- 33호
- 32호
- 31호
- 30호
- 29호
- 28호
- 27호
- 26호
- 25호
- 24호
- 23호
- 22호
- 21호
| No. | Subject |
|---|---|
| Notice | 자유기고 모집 |
| Notice | Fund Raising |
| 344 |
항공우주공학과 News
|
| 343 |
신규 사업 소개 (복합 화학반응을 포함한 극초음속 다원자 혼합물 유동의 입자기반 해석기법 개발)
|
| 342 |
연구실 탐방 (전기추진 및 이온빔 응용 연구실 연구실)
|
| 341 |
연구실 탐방 (Space Testing And Research 연구실)
|
| 340 |
학부생 소식 (2025 봄 해피아워 개최)
|
| 339 |
특집 인터뷰 (이동호 교수)
|
| 338 |
동문 인터뷰 (Caltech 연구원 서종은 박사)
|
| 337 |
Research Highlight (이상봉 교수)
|
| 336 |
항공우주 이야기 (민간 무인 탐사선 블루 고스트 달 착륙)
|
| 335 |
Photo Album
|
| 334 |
항공우주공학과 News
|
| 333 |
연구실 탐방 (익스트림역학 및 멀티피직스 연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