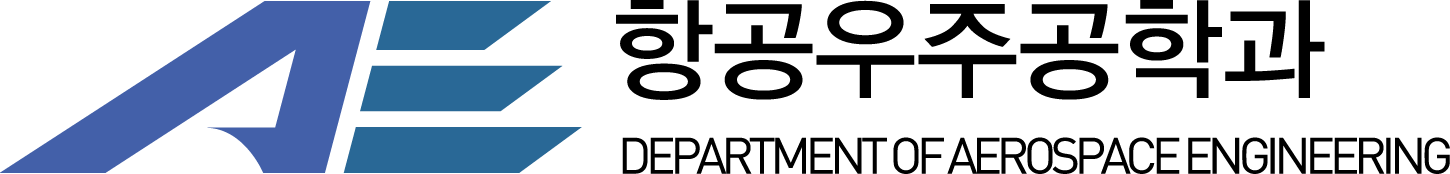특집인터뷰 (김현정 교수)

< 김현정 교수 >
1.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9월 27일부로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부교수로 부임한 김현정입니다. 2009년도에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광유전체 소자 연구실 (photo ferroelectric materials lab.)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밟았습니다. 2009년 2월 졸업 후, 바로 4월부터 임용전인 올 8월 24일까지 NASA Langley Research Center (LaRC)에서 15년간 Research Scientist로 근무하였습니다.
2. 부임하시기 전 NASA에서 (미국에서) 하셨던 연구가 무엇인가요?
나사에 근무하면서 두개의 branch에서 일을 했습니다. NASA에는 Research Directorate (RD), Engineering Directorate (ED), 그리고, Science Directorate (SD)가 있습니다. 제가 근무한 branch는 AMPB (Advanced Materials and Processing Branch)와 AMDSB (Advanced Measurements and Data Systems Branch) 인데, 두개 모두 RD아래에 있습니다. Directorate는 학교의 단과, branch는 학과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NASA LaRC (랭글리 연구센서) 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RD (연구분과)는 LaRC에서 core이며, ED에서 제작하는 항공우주 system, payload에 들어가는 물질과 소자를 만들고, SD가 실제 미션에 활용을 합니다.
1. 나사에서 처음 6년간은 제 “재료 background와 광/전자소자 제작 경험을 토대로 우주에서 사용할 에너지원 (energy harvesting/power generator) 개발 연구를 했습니다. 특히, deep space (심우주) mission에 있어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RTG (radioisotope thermoelectric generator)가 지금까지 화성탐사에 제안된 방식인데, 저는 thermoelectric과 solar cell을 합친 tandem mode를 제안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연구를 했습니다. 또한, ESPG (ElectroStatic Power Generator) 연구도 진행했는데, 음전하로 대전된 달토양을 얇은 박막형 축전 소자와 접촉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달표토 전하를 배터리에 모아 바로 전기로 사용하고, 먼지도 달라붙지 않는 일거양득을 이루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달에서의 장기적인 거주와 탐사는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에 (주거지의 온도 조절, 통신, 탐사 장비 운영 등) 달에서의 에너지 확보는 생존과 연구에 필수적입니다.
2. 2016년부터는 AMDSB에 스카우트되었는데, LaRC의 ISO5 optical cleanroom (https://www.youtube.com/watch?v=idAQDiiHNGo&t=23s )의 PI역할과 더불어, scientific payload에 들어가는 sensor들과 optic을 제작했습니다.
나사는 지적재산의 보호와 국제협력이 제한되는 보안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클린룸에서 센서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센서는 Artemis I 프로그램에서 로켓의 온도 측정과 큐브셋에 들어가는 지구대기관측 장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한 센서들을 직접 우주로 보내서 (2018, 2022, 2025, 우주정거장 특성평가 프로그램) 안정성 평가를 리드하였습니다.
3. NASA에서 기억에 남는 연구나 경험이 있으신 가요?
2016년 AMDSB로 팀을 옮길 때, 새로운 연구를 하고, 새로운 팀을 만난다는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팀을 이루고, 실제 항공 및 우주 미션에 참여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AMPB에서의 연구가 소규모 팀으로 진행되었다면, AMDSB에서는 대규모 팀으로 NASA ED 및 SD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실제 미션에 바로/당장 쓰이는 sensor와 optic제작을 통해서 remote sensing 기술을 완성해갔습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SCIFLI 팀에 payload 제작 리더로 참여하였습니다.
Payload 제작 팀에 센서 제작 및 payload 디자인 팀 리더로 참여한 SAMI (SCIFLI Airborne Multispectral Imager) scientific payload는 Artemis-I 미션에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space launch system의 core stage와 plume induced flow separation 온도 측정에 성공한 장비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제작한 SAMI는 OSIRIS-Rex 미션과 가장 최근에는 2024 solar eclipse 미션에 태양 코로나 온도 측정에도 사용하였습니다. Artemis-I 미션의 경우, NASA JSC, KSC 뿐 아니라, ESA, JAXA와도 협업하면서 미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배우고, training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카이스트 교수가 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To be useful where I need to be” (내가 필요한 곳에서 쓰임 받고 싶어서)” 입니다. 저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떠나고, 내가 꼭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사람들과 일하게 해 달라고” 청했었습니다.
한국은 2024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서 우주연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카이스트 역시 우주연구원 개원을 통해 우주연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으로 익힌 것과 NASA training을 통해 배운 것들을 한국 항공우주 분야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습니다.
물론, 카이스트로 오는 길이 (다양한 의미와 이유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수직은 연구자, 교육자, 선구자, 멘토, 그리고 협업자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런 역할 모두를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묻고 답하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학교 교수님들 한분한분 모두 대단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교육자로서 배운 것을 공유하고, 연구자와 협력자로서 나사 포함 저의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 연구실 학생분들과 카이스트 교수님들과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카이스트 교수가 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기회가 생겼을 때, 한 발 내디디는 용기를 내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곳에서 쓰임 받기를 청합니다.
‘탑재체 센서 및 우주환경 테스트’ 연구실은 (1) 항공우주에 사용되는 Remote sensing 연구와 (2) Space environment test를 합니다.
특히 space remote sensing 연구에 있어서 저희랩은 adaptive / active / reconfigurable 센서를 제안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우주로 보내는 system 및 payload는 Size, Weight, Power (SWaP) 가 아주 큰 키워드 일뿐 아니라 쉽게 보내고, 고장 나면 가서 바로 고치고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때문에 센서에 functionality를 넣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가교정/치유가 가능한 센서가 됩니다.
이는 가령, 거리가 가까워 짐에 따라 자동적으로 beam angle이 바뀌면서 안전한 달 착륙이 가능한 센서와 같은 형태인데, 실내와 실외에서 자동으로 색이 변하는 안경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remote sensor는 천문·우주연구 기반이 되는 관측장비 개발을 통해 태양, 우주기원, 천체진화, 생명발원 등 난제 해결에도 쓰이고, (태양권 관측) 태양과 태양 자기장, 태양풍 관측을 통한 태양 활동 감시, 우주기상 예보 데이터 확보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Space environment simulated system을 제작해서 (우주 환경 모사 장치) 이런 센서들이 우주로 보내져 사용되기 전에 지상 테스트를 통해서 안정성 및 미션 수행 가능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Space environment simulated system은 이런 지상 테스트와 나사 우주정거장 (미국 나사와의 공동협력을 현재 논의중입니다)에서의 실제 실험 결과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우리 database 구축 및 국내 standard 테스트 platform을 완성할 수 있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환경 모사 장치는 달환경 모사 장치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저도 20년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공부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제가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부분 중 하나가 - 내가 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것이 안개처럼 모호했었습니다.
저는 나사에서 배운 bottom-up 연구뿐 아니라 top-down 연구의 구도를 활용해서 연구의 미션 시나리오를 통한 직접 field testing 및 가능하면 제 국제 협력 기관 (나사, MIT, U. of Cambridge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미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일례로, 우리 랩에서 탑재체에 들어가는 telescope lens를 제작한 후, 랩뿐만 아니라, drone을 이용한 ground-based에서의 특성 평가를 합니다. 그 후, 실제 위성기반의 탑재체에 넣어서 활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내/외 협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탑재체 센서 및 우주환경 테스트’ 연구실은 다양한 background의 학생분들 참여가 가능합니다. 항공우주뿐 아니라, Material science, mechanical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ing, computer science, Physics까지 다양하니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6.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연구자로서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가장 어려운 점은 communication의 장벽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말하는 대화는 단순히 한국어를 영어로 옮겨서 의사 전달만 하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즉, 언어의 장벽은 단순한 영어 (English)가 아니라 (American English)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어로 이야기해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American English는 그들의 culture가 잘 뭍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survive 함에 있어서 문화를 이해해야 했고, NASA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문화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문화 안에서 언어가 생기고, 성장하고, 달라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는데, 삶에 있어서는 미국 부부 집에서 7년동안 방 하나를 렌트해서 같이 살았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배우고, 익히고 하면서 미국에 빠르게 동화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사 및 미국 관련 역사책을 찾아서 읽고, 공부하는 것, 그들의 언어를 자주 쓰는 등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그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언젠가 내가 보낸 이메일에는 답장이 안 오는데, 제 주위의 동료 이메일은 꼭 답변을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똑 같은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의 문장들을 모으고, 계속 써먹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이 제 문장에 자연스럽게 섞이고, 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하고, 모사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American English를 익히고, 단방향의 전달이 아닌, 미국인과의 대화의 장벽을 조금씩 극복하였습니다.
즉, 진짜 언어는 culture가 들어간 언어인데 그 culture는 history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들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공부하고, 그들이 언어를 따라 쓰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점 (나사에서 배운 100가지 지혜)” 라는 책도 냈습니다. Baby 연구자로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배운 것들을 100개의 작은 스토리로 쓴 것인데, 그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끝까지 해보세요” 입니다. 끝까지 해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인생, 연애 무엇 하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하다 보면 안되는 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 또 한발짝 나아가다 보면 (자신의 점을 찍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나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도 쌓이게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고,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힘들면 천천히 가보다가, 지치면 쉬고, 안되면 주위에 도움도 청하세요. 그리고, 다시 할 동기와 에너지를 챙겨서 다음 점을 찍어보세요. 끝까지 하면 원하는 바닷가가 기다리고, 산의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점을 찍으면서 한발한발 나아가세요.
옆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챙기면서요. 저도 그런 동료로, 교수로, 협력자로, 가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멋지고, 빛납니다. 고맙습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에 와주어서. 그래서, 이렇게 만날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김현정 교수 드림
원문 김현정 교수[hyunjung.kim1@kaist.ac.kr]
인터뷰, 편집 이은혁[lehx01@kaist.ac.kr]
Comment 0
- Total
- 56호
- 55호
- 54호
- 53호
- 52호
- 51호
- 50호
- 49호
- 48호
- 47호
- 46호
- 45호
- 44호
- 43호
- 42호
- 41호
- 40호
- 39호
- 38호
- 37호
- 36호
- 35호
- 34호
- 33호
- 32호
- 31호
- 30호
- 29호
- 28호
- 27호
- 26호
- 25호
- 24호
- 23호
- 22호
- 21호
| No. | Subject |
|---|---|
| Notice | 자유기고 모집 |
| Notice | Fund Raising |
| 10 |
항공우주공학과 News
|
| 9 |
연구실 탐방 (익스트림역학 및 멀티피직스 연구실)
|
| 8 |
학부생 소식 (이임지 선생님 퇴직 송별회로 따뜻한 감사 전해)
|
| » |
특집 인터뷰 (김현정 교수)
|
| 6 |
동문 인터뷰 (삼성중공업 엔지니어 박성종)
|
| 5 |
Research Highlight (이지윤 교수)
|
| 4 |
항공우주 이야기 (스페이스X 스타십 5차 발사 성공 : 슈퍼헤비 로봇팔 회수)
|
| 3 |
Photo Album
|
| 2 | 자유기고 모집 |
| 1 |
Fund Raising
|